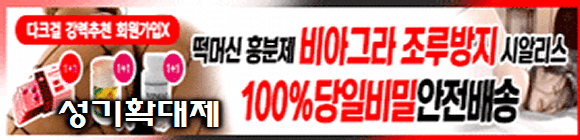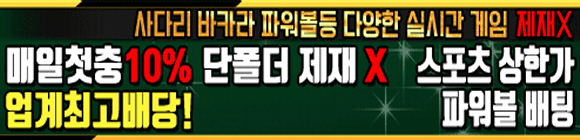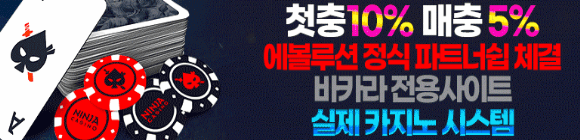린가동자 그래도 폼 토토 가입전화없는 꽁머니 사이트 많이 올렸던데 대니얼 하메스 씨보다 낫지 않음?
작성자 정보
- 먹튀폴리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9 조회
- 목록
본문
반환점인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파미르 고원, 토토 가입전화없는 꽁머니 사이트 해발 3,600m의 카라쿨리 호수 앞에서 설산을 배경으로 찍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더 높은 어디, 인생의 정점을 향한 내 의식의 지향성을 되새겨보곤 한다.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건 인생은 인생이지만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지향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의미는 이면적으로 완연히 달라진다.

내가 배운 인생, 내가 터득한 인생, 내가 지향하는 인생은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다. 그것이 문학을 넘어 더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온전한 삶의 자세라는 걸 가까스로 깨치게 된 때문이다. 표면적 삶의 미망에서 깨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유 기자=맞습니다. 또 하나, 뮤직비디오가 끝날 무렵 멤버 얼굴을 한 명씩 클로즈업해주지 않습니까? 완전 단독 샷이죠. 여기서 눈도장을 완전히 '꽝'하고 받는 건데, 정말 특혜 아이템이라 할 만하죠. '프듀 1'에서는 전소미, 최유정, 임나영이었고요. 이들은 1·3·10위로 마쳐 I.O.I로 데뷔했어요.
1959년 창경궁 (구 창경원)에서 찍은 돌사진. 나는 날 때부터 궁을 좋아했나 보다.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기에 일찌감치 창경궁에서 돌잔치를 하며 궁의 좋은 ‘기’를 받았다. 사진에 단기 4292년이라고 쓴 게 재미있다. 당시만 해도 연도를 단기로 표기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일찍이 집 밖에서 바깥구경을 많이 했다. 어른들 감시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누가 좋은 아이이고 나쁜 아이인지 옳고 그름을 잘 가려, 해질 때까지 신나게 논 골목대장이었다.
여름엔 주로 남산에 올라가 놀았고, 겨울엔 스케이트 타러 서울 변두리의 야외스케이트장에 가 여자애들이 주로 신는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스피드 스케이트를 신은 남자 또래 애들과 스피드 달리기 경쟁도 했다. 발목을 몇 번 삐었지만 그래도 매년 겨울이 오면 그때 먹은 떡볶이와 뜨끈뜨끈한 어묵 국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74년 명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그땐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마냥 웃었다. 여행 중 뭐를 먹었길래 다 한결같이 ‘방귀’ 가스를 내뿜어 우리 스스로 ‘고구마’라 불렀다. 모닥불 피워놓고 춤도 춘 기억도 난다. 대학 2학년 1학기 마치고 미국에 온 후 몇 년간 우편으로 연락하다 끊어졌다. "친구들아, 보고싶다."
‘뺑뺑이’ 고등학교 시절, 난 뽑기에 운이 없나 보다. 변두리에 있는 명지여고가 됐다. 그땐 난 이미 미술에 푹 빠져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루 동선은 학교, 서예 수업, 동양화 수업, 데생화실, 집이었다. 광화문 화실에서 데생 연습을 하다 보면 늦은 밤이 되고 그땐 통금이 있어서 버스 타고 12시 전엔 집에 들어가야했다.
지루한 것이 싫은 난 긴 겨울방학에는 늘 뭔가를 해야 했기에 통기타 치기를 혼자서 배웠고, 음악과 미술, 완전 예능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사군자, 서예, 미술, 글쓰기대회가 있으면 꼭 상을 타온다. 다들 날 보러 ‘신사임당’이라고들 불렀다.
제일 싫어했던 바깥행사는 송충이 잡는 토토 가입전화없는 꽁머니 사이트 거였다. 털이 뽀송뽀송 난 송충이가 머리위나 어깨에 떨어지면 소리치며 온몸을 흔든다. 그래도 안 떨어진다. 한 반에 70명의 학생이 조그마한 콩나물교실에 들어가 종일 같은 자리에서 공부한다. 초와 걸레로 교실 바닥을 학생들이 닦아야 했고, 매일 청소 당번을 번갈아가며 시켜, 교실은 항상 반들반들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스케치여행 사진. 77년이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과애들이 휴강하자 하면 교수들은 그냥 휴강한다. 뭐 좀 배우고자 들어왔는데,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나 자신이 한심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시간이 아까웠다.
학교앞 ‘하이드 파크’라는 컴컴한 음악다방에 들어가 당시 동양화과 학장이셨던 오당 안동숙 교수님께 보내는 장문을 쓰기 시작했다. 편지는 보냈으니 없고, 카피를 안 했으니 다시 읽을 수도 없고,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몇 년 전 내게 노벨경제학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갔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 내겐 결백만이 중요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를 꿈꾸었다지요.”
관련자료
-
이전
-
다음